명포수와 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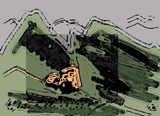
하늘만 가리고 벽면이 없는 천막이었는데 창꾼들은 그 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창꾼들은 군불을 땐 방은 너무 덥고 빈대나 벼룩 따위가 덤벼들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멍석을 깔고 짐승털을 덮어쓰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짐승털이 하얗게 서리에 맞아도 끄떡 없었다.
함경도에서 온 그들에게는 강원도의 추위쯤이야 별게 아니었다.
함경도 사냥꾼들이 도착했던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났다.
다른 사냥꾼들보다 먼저 멧돼지를 잡으러 나갔던 도토리마을 사냥꾼들이 피를 흘리고 절름거리면서 돌아왔다.
그들은 마식령산맥 기슭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지만 겨울에는 사냥을 했다.
“어떻게 된거요. 멧돼지는 잡았소.”
“멧돼지고 뭐고 다 틀렸소. 그놈의 중놈들이 미쳐 날뛰고 있소”
알만했다. 그놈의 중놈이란 봉술승들을 가리켰다.
마식령 중복에 절이 하나 있었다.
자그만한 절이었는데 꽤 오래되었으며 고구려 때 지어졌다는 말도 있었다.
절에는 열서너 명 정도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봉술승 하는 스님이 서너 명 있었다.
표범처럼 날렵한 스님들이었으며 몇년 전에는 산적들을 때려잡은 일도 있었다.
그 절의 주지와 승려들은 짐승들을 사랑했다.
절 경내에 야생 노루들이 들어와 스님들에게 먹이를 얻어먹고 있었다.
노루뿐만 아니라 너구리도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는 절 주위 20리 평방을 부처님의 성역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에서는 사냥을 못하게 했다.
살생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는 알 수 있었으나 그 범위가 너무 넓었다.
절 소유지의 열배나 되는 면적이었는데 많은 짐승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래서 포수들은 짐승들을 쫓아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봉술승들이 그걸 막았다.
포수들도 성질이 사납고 힘이 셋으나 봉술승들에게 당했다.
봉술승들은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별안간 나타나 다짜고짜로 막대기를 휘둘렀다.
그 중은 가볍게 사람 키 높이를 뛰어올랐고 막대기는 풍차처럼 돌아갔다.
박달나무로 만든 막대기였으므로 잘못 맞으면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봉술승들은 그렇게 포수들을 혼내주고 잡힌 짐승들의 사체를 불살랐다.
포수들은 마식령의 봉술승들을 두려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