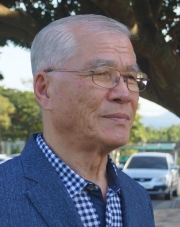
피사체를 향한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가 앵글이다. 구체적으로 촬영 각도, 화면의 구조, 관점 등을 일컬어 흔히 카메라앵글이라 말한다. 사각(寫角)이다.
사진작가에겐 공간시각능력, 창의력, 자기성찰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달리 말해, 높은 수준의 미적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 창의력에 플러스알파로 순발력인가. 대상을 직접 찾아다니는 열정과 적극성은 절대필수다. 거기에 한 켜 유리하게 작용할 게 타고난 참을성일 것이다.
이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진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를 매료시킨다. 대상을 실체 그대로 만나게 하는 사실성이 생동감으로 시선을 압도해 오는 것이다. 사진의 신뢰는 어떤 경우이건 활자의 평면성 위에 군림한다. 특히 신문에서 사진의 위상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 차례 읽고 나서 사진을 다시 한 번 훑는 것은 그것이 갖는 강렬한 인상에 연유한다.
제주新보 고봉수 사진기자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는 네이처(nature)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신문, 통신사 소속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모한 제194회 이 달의 보도사진상으로 큰 상이다. 상에도 상격이 있다. 의당, 눈부신 업적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나는 당초 고 기자가 촬영한 사진(제주新보, 2019.2.18.)을 보는 순간 자지러지게 놀랐다. 여느 사진이 아니라 봄 소재로, 전국 신문을 통틀어 압권이라 감탄했었다. 눈앞에 생생하다. 그날 1면 우측 상단에 실린 “번식기에 들어간 맹금류인 매 한 쌍이 지난 16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해안가 암벽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다”는 해설을 달았던 그 사진. 봄을 앞둔 경향의 신문을 한데 모아 품평회를 열면 어떨까 싶도록 독자의 시선을 압도했다.
나는 그 사진이 내게로 흘러들던 감동을 본란에서 이렇게 썼다. “짙은 어둠을 등지고 희부옇게 이끼 덮인 암벽이다. 거기 겨우내 마른 넝쿨이 걸려 있고 한쪽 바위 위로 날개 치며 내려앉는 날짐승의 그 역동적 동세. 새벽 다섯 시 신문을 받아들고 졸던 눈이 번쩍 띄었다. ‘아, 봄이 왔구나.’ 눈이 그만 사진에 꽂혀 버렸다.”
곧바로 고 기자의 앵글을 뒤좇아 나서며 상상했다. “고봉수 기자는 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 갇혔을 것인가. 긴장과 조바심과 인내 뒤, 시간과 대상물과의 절묘한 조우…순간이 포착해 낸 저 생동하는 한 장의 사진.”
맹금류는 유난히 경계심이 민감하다. 짝짓기 장면을 담아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고 기자는 10시간이 넘는 길고긴 기다림 끝에 한 찰나를 포착해 프레임에 담을 수 있었다 했다. “사진기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동 시대 삶의 모습은 치밀하면서도 예리하다.…오묘한 자연의 순리를 보여주며 아름다움을 선사한 작품”이라 한 심사위원들의 말엔 큰 울림이 있었다.
고 기자의 사진은 오묘했다. 피사체인 매가 높은 곳에 활개 치며 파닥였으니, 밑에서 앵글을 맞췄으리라. 기다리며 그 긴 시간을 얼마나 애타게 숨죽였을 것인가. 사진은 정지됐지만 날고, 뛰고, 솟고, 춤춘다. 공격하고 충돌한다. 사진은 사실과 현장감으로 승부하는 장르니까.
고봉수 기자가 지난 2014 제5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프로필도 관련 기사를 보고 알았다. 비단 이번 사진뿐이랴. 고 기자의 보도사진으로 제주新보가 생광(生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