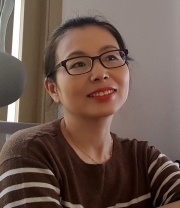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대문 앞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모이고 있다. 이쯤 해선 노랫가락도 들릴 만한데, 휴대용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분이 아직 도착 전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귀에 익은 곡조가 들려온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감귤빛 조끼를 입은, 여든의 고개를 넘었거나 바로 코앞인 예닐곱 명의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길을 청소하다 잠깐 쉬어 가는 곳이, 여러 골목이 한곳에서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한 우리 집 대문 앞이다. 청소 도구들을 실은 낡은 유모차도 주인들 곁에서 잠시 숨 고르는 시간.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기형도 시인의 시구처럼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지만, 아직도 손에서 일을 놓으면 못 견디는 연령대들이다. 어쩌면 붙들고 있는 이 소일거리가 삶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약일지 모른다.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업이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햇살 좋은 날 집에 가만있는 게 미안하다며 빈 등짐 지고 동네 한 바퀴 돌던, 나의 시어머니. 가슴 시리던 그날이 지워지지 않는다.
멀게만 느꼈던 노년의 삶, 그 바라봄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나에게 찾아온 나이 듦을 읽으면서부터다. 애써 외면하던 노화의 실체와 마주한다. 탄력 잃은 피부, 눈가와 이마에 자글자글한 주름, 상깃상깃 나 있는 흰머리. 일상에 스며든 기억력의 쇠퇴는 하루에도 몇 번 머리를 쥐어짜며 혼잣말을 주절거린다. 어디 뒀더라, 언제였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 그뿐인가. 지인들과 대화 중 어떤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자마자 전에 했던 말이라고 놀리듯 통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적마다 눙치며 넘기는 말, ‘너도 내 나이 돼 봐.’ 누군가에게 자주 들었던 말을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 몸에 뭐가 좋다고 하면 팔랑귀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레 온 변화다.
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 같은 것이라 했다. 어느 작가의 표현대로 넘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임인 ‘연속 장애물 경기’를 시작한 거다. 그 말대로라면 나는 지금에야 아주 낮은 장애물 하나 넘은 것에 불과하다. 저 대문 밖의 어르신들이 들으면 같잖은 미소를 지을 것 같은.
하지만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은 서먹하고 가슴 덜컹거리는 일이다. 점점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영화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은 늙어 가는 자신을 감추지 않는 배우이다. ‘나는 내 주름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다. 주름을 돌려 달라’라며 홍보 포스터의 과도한 보정에 대해 두 차례나 반려했을 정도다. 또한 그녀의 SNS에 주름살과 뾰루지를 그대로 드러낸 자신의 민낯을 올리며 주름살 이상의 것을 보라고 당부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깊어진 주름살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나만 늙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 나이 결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음이다. 그리고 깨닫는다. 노화는 발등에 떨어진 치울 수 있는 불이 아닌, 쬐며 꺼질 때까지 지켜봐야 할 모닥불 같은 것임을. 오랜 시간 버텨 온 나이 듦에 마음이 가는 것은 그런 까닭일까.
대문 밖, 쉼을 멈추고 떠나려는지 나직하게 들리던 노랫소리가 다시 커졌다. 저 흥겨운 리듬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신이 났으면.


